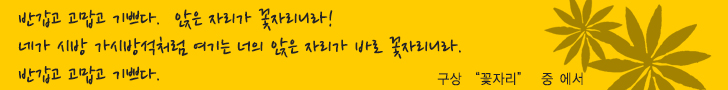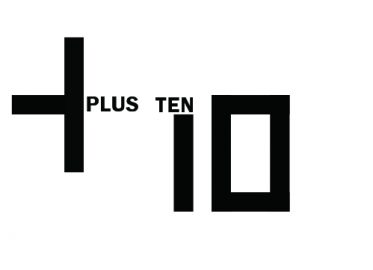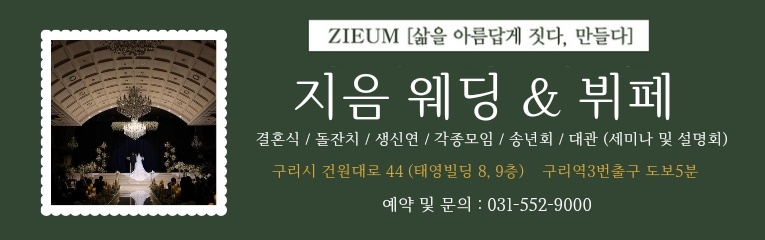나경원과 오세훈을 위한 변명
2020년 4월 15일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던 날이다.
그날은 집권여당의 대승으로 끝난 날이기도 하다. 또한 선거 4연승의 날이기도 하다.
불과 8개월이 흘렀다.
그동안 집권여당의 입법폭주는 눈 쌓인 벌판을 질주하는 설국열차처럼 거침이 없었고, 입법부. 행정부에 이어 사법부까지도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쥐락펴락 하려다 윤석열의 카운터펀치에 맞고 잠시 어리둥절한 상태다.
180여석이라는 타이타닉을 만들어줬음에도 국민들은 야당에 대하여 안타까움이나 일말의 동정도 보내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 4선과 원내대표까지 지낸 나경원은 이름도 모를 무명의 신인에게 일격을 맞았고, 서울시장을 역임하다가 자진사퇴하고 당대표 낙선과 두 번의 국회의원 낙선에 이름을 올린 이도 있었다.
오세훈이다. 서울 시장의 사퇴는 개인에겐 배수진이었지만 국가의 운명은 마치 남동풍이 북서풍으로 바뀌는 형국으로 지나고 보니 대단한 역사적 변곡점이 아닐 수 없었다. 과거를 탓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난날의 되새김질을 통하여 미래로 나아갈 길을 살펴보는 것도 야권의 혁신과 변화의 길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지난 총선은 야당에게 정당사에 있어서 뼈 때리는 일이라는 인식을 해야 함에도 얼마안지나 망각의 동물처럼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 자당의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탄핵당하고 대선에서 지고 지방선거에도 지고 총선에서 졌음에도 말이다. 그중 총선을 진두지휘한 나경원도, 연거푸 두 번의 총선에서 패배한 오세훈도 환한 가면의 얼굴로 다시 서울시장에 출마를 고민한다고 한다. 아무리 막장이라도 공당은 공당이다.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국민들의 선택을 받고자 얼굴을 내미는 형국이다. 차라리 황교안 대표도 나서라고 싶다. 황 대표는 책임을 지고 자숙하고 있지 않는 가 말이다. 내가 오세훈이라면 내가 나경원이라면 한번쯤 쉬어가자고 할 것이다. 야당의 혁신과 변화의 밀알이 될 것이며, 백의종군을 통해 책임을 통감하고 자당의 서울시장 후보를 위해 문지기라도 하는 심정으로 나서겠다고 할 것이다.
지금 야당의 변화와 혁신은 중진이라고 불리는 이들의 살신성인하는 모습과 아름다운 양보 그리고 승리를 위한 야당 단일화 방정식을 만드는데 있다. 비울 줄 알고 질줄 아는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치에서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항변도 하겠지만 지금은 그러한 때임을 나경원과 오세훈은 알아줬으면 한다. 나경원은 국회의원 낙선도 있지만 패스트트랙과 연관이 있고, 오세훈은 서울시민들에게 출마명분이 궁색하다. 멀리 뛰기 위해서는 한번쯤 움츠릴 필요도 있음을 알았으면 한다.
절대 절명의 기회 속에서 선거 4연패의 종지부를 찍을 것인지, 아니면 5연패의 찬란한 훈장의 주인공이 되고 역사 속에서 장엄하게 전사할 것인지를 선택하기엔 이분들의 경륜과 자산이 아깝기에 드리는 말이다.
새해벽두부터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한 몸부림이 애잔하기까지 하다. 일면식도 없지만 사람에 대한 애정을 기반으로 드리는 말이니 고깝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선택은 자기 자신의 몫이다. 버스 올 때 타야한다고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공부하고 운동하고 옷단장하고 있으면 버스는 또 올 것이다.
정치에서 서로가 승리하는 상생의 길을 찾아보는 것이 그리도 어렵다는 것도 알지만 이번 시간에는 백의종군하고 조력하는 길을 선택하여 내공을 축적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을 전한다.

4연패의 야당은 새로움으로부터 시작해야만 한다. 정치신인들이 가열 찬 각축장속에서 경쟁하면서 사자후를 토하는 장면을 보고 싶다. 거침없이 질주하는 패기의 전사들이 눈에 아른거리는 아름다움 모습을 보고 싶다. 하얀 눈이 제법 많이 왔다. 서설이 되어 국민의 시름과 위안이 되길 기도해 본다.
- 상기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