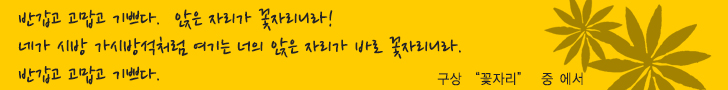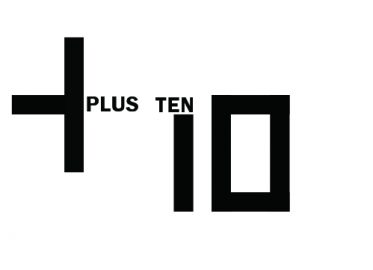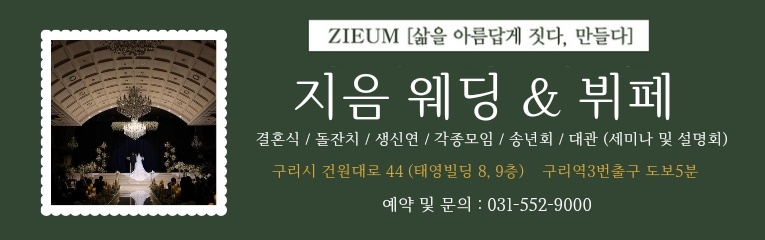[여자는 나이와 함께 아름다워진다]
낭송가 김경복, 그녀가 어느 새 우리들 속에 시처럼 문득 들어왔다
구리 아트홀 유채꽃 소극장 로비에서는 흰 저고리에 쪽빛 치마를 입은 분들이 정갈한 떡과 차를 대접하고 있다. 허기를 채운 이들의 얼굴엔 마음을 채울 기대가 곱게 떠오른다.
막이 오르고 무대 왼쪽엔 우아한 티테이블, 오른쪽 편안한 벤치 뒤 나무그늘 아래 ‘사랑의 인사’가 부드럽게 들려온다. 불현듯 정현종 시인의 ‘사람이 풍경으로 피어나’가 시작된다.
낭랑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무대에는 아무도 없다. 한 줄기 조명이 4열 1번 좌석을 훑자 산뜻한 흰 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젊은 여인이 장난꾸러기처럼 통통 튀며 일어선다.
그녀는 어느 새 우리들 속에 시처럼 문득 들어와 있었다.

관객석 한 쪽에 멈춰선 그녀는 아무것도 없던 바닥에서 꽃 한 송이를 피워내 손에 쥐어준다. 사람들은 어느새 꽃밭이 되어 풍경으로 피어나기 시작했다. “사람이 풍경으로 피어날 때가 있다, 앉아 있거나 차를 마시거나… 그 어떤 때거나”
그녀는 어느 새 희고 고운 목덜미를 드러낸 세련된 블라우스 아래 새색시처럼 빨간 치마를 입고 나왔다. 서구 문명화로 머리는 서구적 사고를 갖고 있지만 나를 이 세상에 단단히 세워 주는 모태는 이 나라 이 땅이라는 뜻인 듯 하다. 무대 위 치맛자락 쓸리는 소리 아래 신달자 시인의 에세이 ‘여자는 나이와 함께 아름다워진다’가 잔잔히 들려온다.
“나는 아직도 여자이고 아직도 아름다울 수 있고… 나는 현재의 내 나이를 사랑한다. 인생의 어둠과 빛이 녹아들어 내 나이의 빛깔로 떠오르는 내 나이를 사랑한다.“ 여자임을 잊게 되어가는 나이, 내가 아름답다 말하기도 어려워지고, 사랑한다는 말을 더는 듣거나 떠올리지 않게 되어가는 관객들이 한숨을 내쉬기도 하고 낭송 중간중간 고개를 간간 끄덕인다.
어느 새 낭송가는 무대 왼쪽 티테이블에 앉아 쪼르륵 차를 따른다. 차 따르는 소리가 여유를 느껴보라 권유하는 것 같다. ‘우리가 차를 마시는 시간은 슬픔을 씻어내는 시간이라네’
젊어서는 뭘 몰라서 바쁘고 나이 들어서는 어중간하게 알아 부산한 우리의 일상에서 흔하게도 하는 인사, 반가운 이나 힘들어 보이는 이를 만났을 때 권하던 말 “우리 언제 차 한 잔 해요.” 는 어쩌면 내가 당신의 슬픔을 씻어 드릴께요 라는 마음이었던가.
2막이 열리자 무대 스크린에는 시가 톡톡톡 타자기 소리와 함께 새겨진다. ‘심심하고 심심해서 왜 사는지 모르겠을 때도 위로받기 위해 시를 읽는다’ 남들은 꽃길 같고 내 삶은 가시밭길 같을 때 어쩌면 그 때가 바로 시를 읽고 듣기 가장 좋은 때 인가 보다.
애잔하게 흔들리는 기타선율이 울고 싶은 마음을 코드처럼 짚어준다. 울고 싶으냐고, 울어도 된다고. 시가 들어와 마음에 쌓인다. 그녀가 읊으니 시가 들리고 그녀가 멈추니 시는 마음으로 들어왔다. 글자가 소리가 되고, 소리가 마음이 되었다.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반나절 반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여기저기 중년의 엄마들이 훌쩍댄다. 가방에서 손수건 찾는 부스럭 소리, 엄마생각에 절로 고이는 눈물을 되돌리려 고개를 뒤로 젖히고 손부채질로 말리며 의자 삐걱대며 서로에게 들려주던 그건, 살아있는 우리들의 시였다.
그렇게 그립고 커다란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자라서 이제는 내가 엄마가 되었다. 아이가 넘어지면 폭 감싸 안아주고 품어주는 그녀의 초록치마는 대자연 바로 우리 어머니의 품이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용서할 일보다 용서받을 일이 많아지는 것이다.”
이 나이에도 아직 어머니 품이 그리운 까닭은 무엇을 해도 용서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리라.
https://news-i.net/wp-admin/edit.php
“황금 저택에 명예의 꽃다발로 둘러 싸여” 사는 삶은 아닐지라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대 가슴 어디에나 영원한 느낌표로 살아있”을 것이기에
“쓰라린 길일지라도 가지 않을 수 없던 길”을 걸어왔지만 그런 내 삶이 아름다웠노라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내가 살아온 길이 모두 내 길이었고 아름다운 길이었음을,
삶이 이렇게도 아름답고, 시가 이렇게 삶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걸 따스하게 들려준
김경복, 그녀가 우리의 메말랐던 마음에 들어왔고 우리는 그제야 우리 삶이 시였음을 느꼈다.
곱게 앉아 절하던 그녀의 무대 인사에 다만 박수로만 고마움 전할 수 있었던 우리 마음에
그득히 남은 것은, 시가 얼마나 우리를 위로하는지 그리고 그 위로는 그녀의 목소리로 들려왔기에 더더욱 따스했노라고 전하고 싶다.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면 되겠다고 안심해 본다.
– 문화예술 자유기고가 김지연